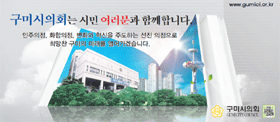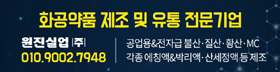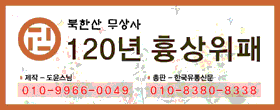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창간6주년기념기획특집(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100년 전의 한반도 정세와 현재 정세를…
러일전쟁승전탑 앞 일본군 기념촬영사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극일(克日, over-Japanese)을 위해선 우리 민족의 기원을 알아야
한국민족의 기원, 흥수아이 "우리 민족은 한반도 석회암 동굴에서 시작됐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9년 8월 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리나라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열어 뜨거운 민족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아베 규탄 시민행동'에서는 일제 당시 강제 동원되어 부당 노동 착취를 당했던 조선인들을 기억에 되새기며 "100년 전 가해자였던 일본은 다시 한국을 대상으로 명백한 경제 침략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수은주의 높이가 한없이 치솟아만 가는 무더운 여름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본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강도 역시 높아만 가고 있어 더욱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방송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불행했던 과거사도 언급하며 "가해자인 일본이 상처를 헤집는 상황을 국제사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2차 무역보복에 대해 "이렇게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했으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며 딛고 일어서려는 양국의 노력을 무색케 만든 것에 대해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반복된 과거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자세에 대해 국민으로서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뜨거운 물결 또한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넘치는 시점이다.
지난 100년 전의 한반도의 정세를 반추함으로서 작금의 한반도가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는 것 또한 선진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요소다.
지난해 6월 본지의 요청으로 자문위원인 권수근 박사는 100년 전의 한반도 정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예측과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현자적인 자세를 고취할 수 있도록 역사를 되짚어 정리했다.
본 내용은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연구를 시작으로 삼남의 농민봉기,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개요, 끝나지 않는 패권-러일전쟁,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앞으로의 한반도(결언) 등으로 구성해 현재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끼쳐온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본지에서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100년이 지난 지금도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의 정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오늘날의 정세와 지난 과거의 정세를 역사적 인과성의 관계로 풀어 나갈 계획이다.
(1)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러일전쟁 승전 기념의 '일본해해전기념탑'
1929년 5월 29일 준공, 광복 후 이승만 정권 때 철거됐다.
준공기념으로 스모 대회를 여록 있는 일본군의 모습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창간6주년기념기획특집(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100년 전의 한반도 정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