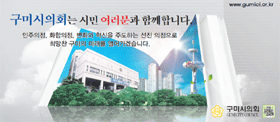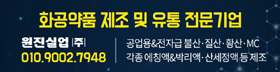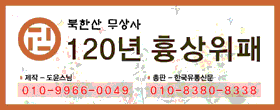보이지 않는 ESS 비용, 한전 200조 빚더미에 또 폭탄
낙찰가·정산액 비공개 속 비용은 한전 부담…요금 반영 지연 땐 배임 논란까지
LCOE서 빠진 보상·백업·ESS 비용, 결국 국민 부담?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도입 비용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KP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ESS 중앙계약시장 관련 핵심 가격정보가 비공개로 묶여 있어 사회적 비용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반영이 지연될 경우 한전의 배임 소지까지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만 ‘최대 3조’…ESS 중앙계약시장 급가속
정부는 5월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563MW)을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어 2차(540MW)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두 차수를 합한 총사업비는 3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2GW, 2038년까지 23GW 수준의 ESS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의 초입에 해당한다.
비용은 한전 부담 구조…그런데 ‘가격정보 비공개’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과 ‘ESS 중앙계약시장 전력거래계약서’에 따르면 ESS 설치·운용 관련 비용은 전력시장 구매자인 한전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산업부와 KPX는 1차 입찰의 낙찰가 평균과 정산 예상금액 공개 요구에 대해 “우선협상자 영업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낙찰 사업자의 영업비밀 누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구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을 ‘영업비밀’ 이유로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요금 현실화 지연 시 배임 논란…한전 ‘빚더미’ 가중 우려
ESS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분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 경영진의 배임 소지까지 지적된다. 현재 한전의 지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7.51%, 외국인 15.18%, 기타 26.21%로 구성돼 있다. 한전 총부채는 2017년 108.8조 원에서 2022년 192.8조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05.4조 원에 달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요금 현실화 지연으로 이미 200조 원대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ESS 비용까지 ‘조용한 폭탄’으로 떠안는 격”이라고 말했다.
LCOE 낙관론의 ‘빠진 비용’…보상·백업·ESS는 제외
정부·여당은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한다. 산업부가 제출한 추산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2년 kWh당 102~132원에서 2036년 54.8~99.1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수치에는 주민·토지 보상, 계통 안정화를 위한 백업전원, ESS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장밋빛 LCOE만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실제 부담은 한전과 국민이 뒤늦게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SMR’ 카드…용량계수·온실가스 측면 부각
구 의원은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적극 활용을 제시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정책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발전설비의 가동 안정성을 뜻하는 용량계수에서 원자력은 93%로 가장 높고, 태양광 25%, 풍력 34%로 낮다”며 “SMR은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저감에 유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솟는 전기요금에 속도조절에 나선 독일 사례처럼, 한국도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