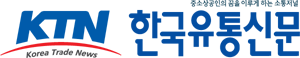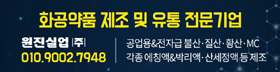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칼럼] 폐차장은 누구의 삶터인가. 뉴질랜드의 어느 시골 부부 이야기에서 한국 농촌을 떠올리다

글쓴이 박춘태(교육학 박사)는 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및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
2025년 겨울, 뉴질랜드 남섬의 작은 마을 스프링스턴(Springston)에서 한 부부가 법정에 섰다. 이유는 그들이 수년간 운영해온 폐차장 때문이다.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이 공간이, ‘이웃의 불만’이라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 시작은 단 한 통의 민원이었다. 그 민원이 접수된 지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 카운슬은 강제 철거 혹은 철거 비용을 이들에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루켄과 엘리자베스 길트랩 부부는 2015년, 크라이스트처치 외곽의 시골 마을에 폐차장 사업을 시작했다. 부지는 2헥타르 남짓. 땅 위에는 400여 대의 차량과 각종 부품이 놓여 있다. 누군가의 눈에는 ‘지저분한 고철 더미’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친 직업의 현장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무대다.
카운슬은 이들이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장 주변의 울타리와 조경, 폐기물 관리 등 모든 항목이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다. 반면 부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했고, 그동안 주변 이웃들과도 큰 마찰 없이 지내왔다고 주장한다. 길트랩 부부는 “어떤 날은 양들이 울타리 너머로 들어와 고철 더미 사이를 거닐기도 한다”며 웃었지만, 이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와 상처가 묻어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한국 농촌의 모습이 겹쳐졌다.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삶을 일구어 가는 이들이 있다. 고철을 모아 생계를 잇거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 조용히 농막 하나 짓고 농사를 짓는 귀촌인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허가’와 ‘기준’이라는 이름 아래 위협받고 있다. 누군가는 단속 대상이 되고, 또 누군가는 소음 민원이나 경관 훼손이라는 이유로 쫓겨난다. 법은 필요하다. 기준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깃든 삶의 맥락, 공동체의 온도, 한 개인의 존엄까지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뉴질랜드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다. 카운슬이 나선 것도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쪽의 목소리가 또 다른 한 쪽의 생존을 짓누르는 결과가 되었다면, 우리는 ‘균형’이라는 단어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물음에 앞서, ‘누구의 삶인가’를 먼저 묻는 시선이 필요하다.
길트랩 부부의 폐차장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이 있다. 양들이 뛰놀고, 철제 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며,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고장 난 부품을 얻기 위해 들른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시간이 축적되고 기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공간이 많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의 정비소, 시골길 끝자락의 농기계 창고, 작은 시멘트 공장 하나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 생존의 뿌리를 뽑기보다는 보듬어야 한다.
현재 뉴질랜드 카운슬은 ‘강제 철거’라는 최후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만약 그 결정이 내려진다면, 부부는 몇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지역 언론의 보도는 또 다른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를 불러오고 있다. 법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사회는 누군가의 삶을 법의 언저리로 내몰기보다, 공존의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뉴질랜드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도시화, 개발, 그리고 표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생존과 존엄이 부딪히는 순간들. 그때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자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규정이 아니라 공감으로, 제재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아닐까.
길트랩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 농촌과 도시 외곽의 ‘조용한 생존자’들이 떠오른다. 그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사회, 묵묵히 일한 삶이 존중받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 아닐까.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