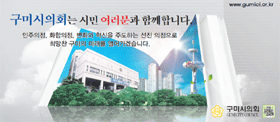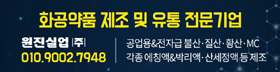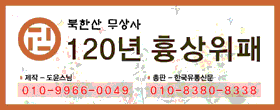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사설] 『환단고기』, 위서인가 민족의 자서전인가

역사는 국가와 민족의 뿌리이며, 그 뿌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떤 역사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어떤 역사는 ‘공식 서사’로 구분하며, 특히 자주적 사관이 담긴 사서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향이 짙다. 『환단고기』는 그 대표적인 예다.
『환단고기』는 1911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스승 이기의 유촉을 받아 간행한 한민족 상고사 총서이다. 환국·배달·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성조의 역사를 정리한 이 책은,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정책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우리 역사와 정신의 원형을 되살리려는 간절한 염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초간본은 대부분 사라졌고, 1948년 남하한 제자 이유립을 통해 한 부가 전해지다 1976년 분실되었다. 이후 그의 제자 오형기가 1949년 필사한 정서본이 오늘날 유일한 단초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전승 구조는 분명 완전한 과학적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단사학계는 『환단고기』를 위서로 규정하며 그 사서적 가치를 일축해왔다. 그러나 전재우 박사의 서지학적 분석은 이런 일방적인 결론에 균열을 낸다. 그는 『환단고기』의 편찬 경위, 전수 내력, 정서본의 필사자 오형기의 인물됨과 학문적 자질, 그리고 1979년 출간된 두 판본—광오이해사본과 배달의숙본—의 계보를 면밀히 추적했다.
특히 배달의숙본이 광오이해사본의 수정본이라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배달의숙본이 『환단고기』의 정본(正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등장한 일본어 및 한국어 번역본들이 광오이해사본을 저본으로 했다는 점은, 왜곡된 텍스트가 일찌감치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환단고기』가 진본이라 확신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초간본 부재를 이유로 사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학문적 게으름이자 식민사관의 잔재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어떤 철학으로 이 책을 엮었는가에 대한 맥락적 해석이다. 계연수와 이기의 ‘홍익사서’라는 명명부터, 민족정신 회복을 위한 출간의도까지,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책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일제의 폭력에 맞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려 한 시대의 기록이며, 정신사적 선언문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사서에 대한 선입견과 이념적 잣대로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환단고기』가 담고 있는 자주정신과 민족의 기원을 향한 문제의식은 그 자체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왜 그런 역사 복원이 시도되었는가를 이해하는 태도이다.
『환단고기』는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며, 나아가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이냐는 민족 정체성의 질문이다.
글쓴이: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형
논문보기 바로가기
『환단고기』는 어떤 사서인가? - 서지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What does define Hwandangogi as a history text? : A bibliographical perspective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