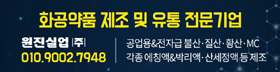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칼럼]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크림 사이. 뉴질랜드에 살며 발견한 여행지의 풍경

글쓴이 박춘태(교육학 박사)는 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및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더 그렇다. 차갑고 쌉싸름한 커피 한 모금이 머리를 맑게 해줄 것 같고, 얼음이 들어 있으니 수분 보충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가깝다.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이미 부족해진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킨다. 그 결과 두통은 오히려 심해지고, 몸은 더 피곤해진다. 숙취 해소에는 보이차, 꿀차처럼 자극이 적고 체액 균형을 돕는 음료가 낫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해장이 끝난 뒤, 몸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마셔도 늦지 않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생활하다 보면,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자주 느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행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풍경이다. 해변이든, 작은 마을이든, 관광지 산책로든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특별히 더운 날도 아닌데 말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낙농 국가다. 신선한 우유와 크림이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지역마다 자신들만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살아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말이면 “이 마을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파는 작은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선다. 여행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맛과 시간을 함께 음미하는 행위다.
또 하나는 이들의 여행 태도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서두르지 않는다. 무엇을 꼭 해야 한다는 압박도 적다. 걷다가 멈추고, 풍경을 보고,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으로 여행은 충분히 완성된다. 차가운 커피로 정신을 억지로 깨우기보다, 천천히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는 그 여유가 이 나라의 리듬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크림은 모두 차갑지만,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방식은 다르다. 전자는 각성을 재촉하고, 후자는 속도를 늦춘다. 뉴질랜드에 살며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 이곳 사람들은 피곤할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보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점이다.
여행지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빨리 회복하려 애쓰기보다, 천천히 즐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아이스크림이 더 잘 어울리는 풍경. 그 속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용히 담겨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