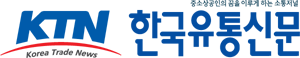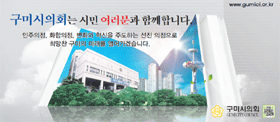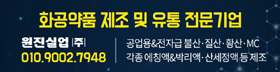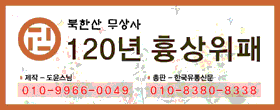박기영 시인 '무향민의 노래' 시집 출판기념회, 고향 그리움 가슴 저며오는 애틋한 이야기 담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일요일 정오,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씨앗카페에서는 박기영 시인의 '무향민의 노래 시집(도서출판 한티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95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박기영 시인은 평안도 맹산 출신의 포수인 피난민 아버지와 경북 상주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원주, 마천 등지를 전전하다 대구에 정착해 성장기를 보낸 그는 대구 달성고 2학년 중퇴 후 중국집 배달 일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업을 두루 거쳤다.
박 시인은 198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사수의 잠' 이 당선된 뒤 '우리 시대의 문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에 들어갔다. 박기영 시인은 1985년 장정일과 2인 시집 '성.아침[청하]', 1991년 '숨은 사내[민음사]'를 펴냈다.
시단에서 떠나 25년간 KBS방송작가를 마지막으로 현재 충북 옥천에 터를 잡아 옻을 활용한 된장과 음식 및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박기영 시인은 시단에서 불세출의 천재시인으로 평을 받고 있는 장정일을 키워낸 '문학적 스승'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특히 그의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사수의 잠'은 당시 중앙지 신춘 당선작들을 압도하는 탁월한 시로 평가되고 있다.
射手의 잠
그날, 어둠 쌓인 슬픔 속에서
내가 버린 화살들이
어떤 자세로 풀밭 위에 누워 있는지 모르더라도
나는 기억해내고 싶다, 빗방울이
모래 위에 짓는 둥근 집 속으로 생각이 젖어 들어가면
말라빠진 몸보다 먼저 마음 아파오고,
머리 풀고 나무 위에 잠이 든 새들이 자신의 마당에 떨어진
별들이 그림자를 지우기도 전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이름을 가슴에 새겨둘 수
있는지.
추억의 손톱 자국들 무성하게 자란 들판 너머로
노랗게 세월의 잎사귀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나는 벽에 기대여서도
하늘 나는 새들의 숨쉬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숲에 닿지 않아도 숨겨진 짐승의 발자국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접혔던 천생의 달력을 펴고
이마에 자라난 유적의 잔가지들을 헤치고 들어가면
태양계 밖으로 긴 꼬리를 끌고 달아나던 해성이
내가 땅 위에 꽂아둔 화살의 깃털을 집기도 전에
진로를 바꾸어 해보다 더 큰 빛을 발하며 내 품안으로 날아 들어오
는 것도
나는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땀 젖은 윗도리를 벗고
어둠과 함께 가만히 별자리에 떠 있으면
나는 또 모든 것을
등뒤에 새겨둘 수 있을 것 같다.
태양의 곁에 누워서 자전의 바퀴 굴리지 않더라도
걱정에 사인 별들이
저녁이면 다시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까닭을,
역마살이 낀 내 잠의 둘레에
어떤 별들이 밤이면 궤도를 그리며 떠돌고 있는 것인지.
-박기영, <射手의 잠> 전문
출판기념회에서 박기영 시인은 마지막 탈고를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사실과 함께 책이 나오고 나서 시집에 등장했던 '평양에서 온 편지'의 주인공 김련희씨와 같은 경우 "평양에서 온 편지가 아닌 이젠 평양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기분이 좋다"는 말과 함께 "(북한에) 1500~1600만 정도 낭독이 되면 실향민들의 이야기가 알려질 것"이라며 출판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지인 정호영 선생은 박기영 시인의 시집 출간에 대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서사시"라며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으며,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씨앗카페의 신휘 시인은 시집 내용 중 '원적지1' 시를 통해 실향민인 박 시인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애틋한 사연을 낭송했다.
원적지1
평안남도 맹산군 수정리 300번지
이제는 아무리 밤새워
편지 써도
이름 아는 사람 없어
편지 부치지도 못하는 주소지
북진한 국군에
목숨 붙이려고 엉겁결에
치안대 가담했던 아버지가
눈보라 속에 나타난 인민군 아들
총부리 피해
야밤에 홀로 떠나온 그곳
밤이면
겨울 글씨 배운 국민학교 아들에게
남폿불 밝혀 놓고
또박또박
가슴속에 고인 침 묻혀
연필 끝 눌러 새겨 놓았던 주소
수없이 살다가 세상 떠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평안남도
맹산군 수정리 300번지
휴전선 너머 북쪽 낭림산맥이 손 뻗어 반도
쓰다듬던 자리.
낯선 마을 동네 묘지에
눈물로 아버지 묻으면서도
결코 비석 뒤에
당당하게 새겨 놓지 못한 주소
아직도 내가 날마다
가슴속으로 숱한 편지 써서
부치지 못하고 있는 그곳
단 한 번도 가 본 적 없어 아득하기만 한
내 삶의 원적지
평안남도
맹산군 수정리 300번지
(무향민의 노래, p30)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아들이 한평생 옆에서 지켜 본 아버지의 가슴 아픈 옛 이야기가 가슴 구구절절히 와닿는 싯귀에 대해 뭉클한 마음이었다. 지인 김영화 선생은 원적지란 단어를 떠올리며 "저희 젊은 세대들은 고향이라는 말 조차도 잘 쓰지도 않는다. 우리세대는 얼마나 포스랍게 살았던가에 대해 되돌아 보고 투덜거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며 '원적지3'을 낭송했다.
원적지3
도로명 주소로
집 주소가 바뀐다는 소식에
털컹 가슴
내려앉았던가을
우편번호도 없는
그곳에 가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백성 되려다가
백발 노인이
심우도 주인공처럼 소끌고
휴전선 넘는 것 보고
부리나케 돌아와
원적지로 띄워 보낼 무수한 말들
가슴에서 퍼올렸다 지웠다.
그곳에 사는 사람 놀랄까 봐
혼자 끙끙거리며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평안남도
맹산군 수정리 300번지
행여 내 죽은 뒤에
그곳 새로운 주소 알게 되면
이 편지 고이 접어
부쳐 달라고 다짐의 문자
편지처럼 꾹꾹 눈물로 눌러 보냈다.
(무향민의 노래, p36)
박기영 시인은 이번 시를 엮으면서 9편의 시를 뺐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내 무향민이 아닌 팔레스타인 난민 이야기 대한 사연을 담은 시였다고 했다.
박 시인은 "무향민은 한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에 협조해 통일되고 난 뒤에 그 부족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골짜기에 폐쇄공간을 만들어 갇혀 사는 부족에 대해 만났던 사연을 얘기하며 특이한 취재 경험과 함께 상당히 슬펐던 기억이었음을 알렸다.
박기영 시인은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형식 다른 방식으로 발표하려려고 한다며 시극 또는 다른 시집을 통해 지금 시대에 맞는 전달 방식을 찾아 알릴 계획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