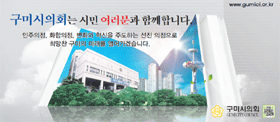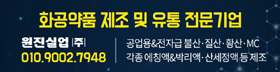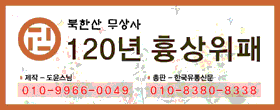아르떼뉴텍 그림이야기(12) -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김홍도)
(전국 = KTN) 이용범 기자 =

이 그림은 김홍도(1745~1806 이후)의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이다. 시동(侍童)을 대동한 선비가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중 꾀꼬리 한 쌍이 노니는 소리에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를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조선 후기의 풍속을 소재로 삼아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세심한 모습을 서정성 깊게 표현한 작품으로 그림의 왼쪽 상단에는 동료 화가인 이인문의 시문이 쓰여 있다.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 그림은 인물 묘사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말과 마구에 사용된 부드러운 필법, 선비의 시선과 표정, 대담한 공간감 등이 잘 어우러져 김홍도가 추구한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출하고 있다.
종이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려진 이 그림은 크기가 세로 117㎝, 가로 52.2㎝로 수직으로 긴 화폭 하단 오른 편에서 비스듬히 아래로 쏠리는 언덕과 길을 대각선 구도로 잡고 있다.
이 그림에는 봄날의 시정(詩情)이 화면 전체에 흥건하다. 비가 갠 봄날,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온 봄기운에 선비 한 명이 나귀를 타고 동자를 앞세워 봄을 찾아 나선다. 촉촉한 대기를 머금은 버들가지에 연녹색 잎이 돋고, 길섶에 파릇하게 움튼 풀이 싱그럽다. 산천에 온갖 꽃이 다투어 피고, 들판에는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어 봄빛을 더한다. 빛나는 계절 봄, 유유자적 길을 밟아가던 선비가 버드나무 아래를 지나다 문득 고삐를 당겨 가던 길을 멈춘다.
황금빛 꾀꼬리 한 쌍이 나무 위를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노래로 짝을 유혹하고 있다. 한적한 봄날의 고요함을 가르는 꾀꼬리의 맑고 화사한 지저귐, 누군들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는가. 선비는 고개를 돌려 버드나무 위 꾀꼬리를 올려본다. 동자도 선비의 시선을 쫒아 같은 곳을 바라보고, 멈춰 선 나귀마저 귀를 쫑긋 세우고 꾀꼬리의 노랫소리에 반응한다. 연둣빛 주렴 같은 버들잎 타고 내린 꾀꼬리의 노랫소리는 선비와 동자의 시선을 따라 흘러, 감상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다. 상단의 텅 빈 여백은 너른 들판일 수도 있고, 잔잔히 흐르는 강물 일 수도 있지만, 봄 소리의 울림통이고, 아련한 봄 정취의 깊이이다.
이 그림, 마상청앵도는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有聲之畵), 그림은 소리 없는 시(無聲之詩)’라는 옛말이 절로 떠오를 만큼 그림 좌측 상단에 적혀 있는 동료 화가인 이인문의 시와 그림이 기막히게 어울린다.
“佳人花底簧千舌, 韻士樽前柑一雙
고운 여인 꽃 밑에서 천 가지 소리로 생황을 부는 듯,
시인의 술동이 앞에 귤 한 쌍이 놓인 듯하다.
歷亂金梭楊柳岸, 惹烟和雨織春江
금빛 베틀 북이 어지러이 버드나무 물가를 오가더니,
안개와 비를 엮어 봄 강을 짜낸다.
'마상청앵도'의 선비는 단원 김홍도 자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원은 여느 시인보다도 풍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고, 여느 문인에게도 뒤지지 않는 교양과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평생토록 문인의 의식을 품고 문인의 삶을 꿈꾸며 살았다. 하지만 각별한 사랑을 쏟았던 정조가 타계한 이후로는 그런 꿈마저도 호사였다. 아들의 월사금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상청앵도'에서 꾀꼬리를 바라보는 선비의 눈에는 무언지 모를 애틋함과 아련함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꾀꼬리의 노래가 아닌, 아마도 스치듯 지나간 정조의 총애를 받던 인생의 봄날일 것이다.
이 그림 마상청행도에는 소리가 있고, 색이 있고,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여백의 맛이 있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림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봄날에 대한 감정이입에 젖어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