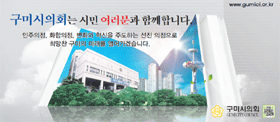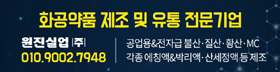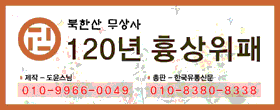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칼럼] 세금의 품격, 단순함에서 시작된 신뢰. 뉴질랜드의 GST가 한국에 주는 교훈

글쓴이 박춘태(교육학 박사)는 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및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있다.
“세금이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세제정책 전 책임자 마이클 킨(Michael Keen) 교수가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GST) 제도를 두고 한 찬사는 단순히 세금 기술의 우수함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그는 “뉴질랜드의 GST는 효율성, 공정성, 단순성이라는 세금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세금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신뢰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GST는 단 한 가지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 “모든 소비에 동일한 세율 15%를 적용한다.” 음식, 서비스, 심지어는 외식까지도 예외가 없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공정함의 근본이다. 누가 소비하든, 어떤 상품을 사든 동일하게 세금을 낸다. 세율은 단순하지만,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깊다. “세금은 불가피한 부담이 아니라 공정한 책임”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일반 세율은 10%지만, 수많은 면세와 감면 조항이 뒤얽혀 있다. 농수산물, 교육, 의료, 문화, 일부 음식물은 면세 대상이다. 겉보기엔 서민을 배려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행정과 불투명한 세제 운영을 낳았다. 면세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늘 따라다닌다.
뉴질랜드의 세금 철학은 놀라우리만큼 단순하다. “예외를 만들지 말라.”
IMF의 킨 교수는 “뉴질랜드 국민은 소비에 대한 과세를 공정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소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평균 부가가치세(VAT) 세율이 22%로 뉴질랜드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세수 비율이 더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잡한 감면 규정을 없애고, 넓은 과세 기반을 유지하니 세금이 새지 않는다.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세수가 확보된다. 행정비용도 줄고, 납세자와 정부 사이의 불신도 없다.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매년 세제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감면 항목이 추가되고,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위한 ‘예외 규정’이 늘어난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세금은 더 많이 걷히는데, 국민은 더 불만이 쌓인다. 왜냐하면 ‘나만 손해 본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복잡함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세금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뉴질랜드의 GST 제도는 단순함 속에 신뢰를 세운 제도다. 납세자는 세금을 내면서도 억울하지 않다. 정부는 세금을 걷으면서도 변명하지 않는다. 그 단단한 신뢰의 고리는 세율 15%라는 숫자보다 훨씬 값지다.
세금이란 결국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믿는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물론 뉴질랜드에도 과제가 있다. 킨 교수는 “앞으로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 세수가 필요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이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논의는 언제나 ‘신뢰’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세율을 올리더라도, 국민은 그 이유를 납득한다. 정부가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 정책은 어떠한가.
조세 개편의 방향은 늘 ‘복잡성의 미로’로 빠진다. 세율을 올리면 민심이 흔들릴까 두려워 감면과 예외를 늘리고, 그 결과 세제는 누더기가 된다. 세금을 걷는 목적은 점점 불분명해지고, 국민은 세금을 내면서도 “과연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는다.
세금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뉴질랜드의 또 다른 특징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한 진지한 논의다. 현재 뉴질랜드는 일부 자본이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킨 교수는 “모든 자본이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세체계의 일관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세금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로 투명성의 상징이다.
한국에서도 자본이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종종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이익집단의 이해’에 따라 흔들린다. 정책의 일관성은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진다.
뉴질랜드의 재무부는 이미 경고했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 부담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다. 복잡한 감면보다 명료한 과세, 정치적 인기보다 제도의 신뢰를 택한다. 그 단단한 원칙이야말로 뉴질랜드식 복지국가의 숨은 힘이다.
공정한 세금이란 복잡한 계산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함 속에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며 불만을 품지 않는 사회, 세금을 걷는 정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그 시작은 ‘단순함의 용기’다.
뉴질랜드의 GST는 그 용기를 보여줬다.
복잡함을 덜어내고, 원칙을 세우며, 신뢰를 지켰다.
한국이 그 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라, 세금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철학’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단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나은 사회,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공정하고 단순한 세금’에서 시작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