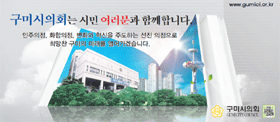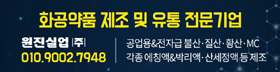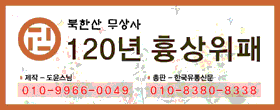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사설] ‘내 집 마련’의 꿈, 어쩌다 ‘지옥’이 되었나
제도의 허점과 감시의 부재가 키운 ‘지옥’, 조합원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지역주택조합’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파는 사업 모델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최근 한 지방 도시 A 지역주택조합의 사례는 그 꿈이 어떻게 무너지고, 희망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A 조합의 조합원들이 공유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그들의 여정은 끝없는 재정적 부담의 늪과 같다. 당초 2억 원 후반대로 시작했던 사업은 어느새 조합원 분담금 5억 원을 훌쩍 넘기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채팅방에서는 “공사 도중에 추분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약속했던 브릿지 대출 상환은 지연되고, 그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된다. ‘저렴한 내 집’이라는 최초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라는 공포만이 남았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다.
더 큰 문제는 불투명한 운영이라는 ‘블랙박스’다.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주택법상 명시된 월별 자금 집행 내역이나 회의록 공유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공개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실체가 불분명해 보이는 업체에 지급되고, 설계 업체가 명확한 설명 없이 수차례 변경되며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정황이 제기되어도, 조합원들은 그저 ‘깜깜이’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총회 의결도 없이 유급 상무를 임명하고 연봉을 책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은 조합 운영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통제된 정보가 유통되는 ‘메아리 방’ 안에서 증폭된다.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원은 ‘이리떼’, ‘방해 세력’으로 낙인찍힌다. 일부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과 비현실적인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운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착공했다”고 단언했다가 며칠 뒤 “4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모순된 정보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결국 조합원들은 ‘닥치고 똘똘 뭉치자’는 식의 비합리적인 구호 아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포기하게 된다. 이는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을 용인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이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의 침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보에 밝은 지역 인사들은 물론, 일부 언론인들까지 A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의혹을 낳는다. 사태의 본질과 구조적 문제점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파헤치고 공론화해야 할 언론이, 정작 스스로가 이해당사자가 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혹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감시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 이는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가해 행위와 다름없다. 이들의 침묵은 결국 ‘깜깜이 조합’이 외부의 견제 없이 폭주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A 조합의 사례는 비단 한 곳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최근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듯,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박 의원이 언급한 "공사비 과다 증액, 정보 비공개,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의 구조적 문제는 A 조합원들이 겪는 '지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나서도, 조합에 자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크다. 바로 이 제도적 허점이 조합의 '블랙박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인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A 조합이 속한 지자체장의 행보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그는 시공사 D건설과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외형적 성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이는 지자체장으로서 당연한 역할일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조합 내부의 불투명성과 재정적 압박이라는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다. 조합원들의 대화에서는 지자체장이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나, 현실은 조합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관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묻어난다.
‘값싼 집’이라는 꿈은 조합원에게 팔았지만, 그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조합원에게 떠넘겨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지옥주택조합’이라 불리는 이유다.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지자체가 시민의 재산과 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할 때다. 당국이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방관자로 남는다면, '지옥주택조합'의 비극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글쓴이: KTN편집부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지옥주택조합, #지주택문제점, #지역주택조합피해, #추가분담금, #사업지연, #조합원분담금, #시공사교체, #조합운영, #불투명회계, #정보비공개, #지주택소송, #부동산사설, #내집마련, #언론도덕적해이, #지자체역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