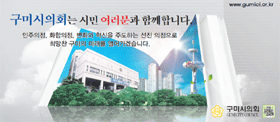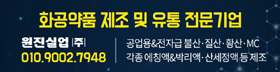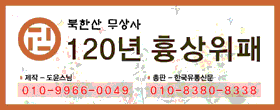[데이터거래사 심층분석(2)] AI 시대의 데이터 전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강연자: 김세현 (데이터 경제 전문가)
주요 경력:
중공업 분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동화, 메카트로닉스, 로보틱스) 10년
한국인공지능협회 초기 멤버, AI 인증센터 근무 (데이터/AI 모델 검토 및 테스트)
현재 AI 교육 플랫폼 운영
기술의 파편화 속, 데이터 가치를 꿰뚫는 ‘거래사의 눈’이 필요하다
[한국유통시문 김도형 기자]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산업은 역설적으로 ‘성장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기술은 파편화되고, 현장의 수요와 공급은 서로 엇박자를 내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이터거래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제11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현장에서, 김세현 데이터 경제 전문가가 제시한 미래 데이터 전문가의 생존 전략을 짚어봤다.
■ 데이터 산업의 명과 암: “쓸 만한 데이터가 없다” vs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데이터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교육 현장에서는 ①법·제도적 규제, ②전문 인력 부족, ③데이터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공통적으로 꼽혔다. 특히 정부 주도로 공개된 AI 허브의 데이터조차 “막상 현장에서 쓰려니 쓸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세현 강사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다.
“데이터의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데이터도 특정 산업의 전문가나 숙련된 개발자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거래사는 바로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데이터의 가치를 단순히 지표로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 모델에 적용했을 때 사용자가 체감하는 ‘동적 지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데이터의 품질이 기술적 스펙을 넘어 현장 활용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 포토샵을 만들 것인가, 그림판을 만들 것인가? - MVP의 중요성
김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만약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포토샵과 그림판 중 무엇을 먼저 개발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부가 가치가 높은 포토샵을 선택했지만, 그는 “포토샵의 핵심 DNA는 그림판에 있다”고 답했다. 그림판의 기본 기능 없이는 포토샵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 비유를 통해 ‘최소 기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많은 기업들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고품질, 고해상도 데이터로 AI 모델을 만들려다 실패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이죠. 가장 작은 단위의 기능(그림판)부터 시작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확장(포토샵)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데이터 거래를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다. 데이터거래사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의 현실적인 역량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박스 기사>
|
실패에서 배운다: 가방 속 물건 인식 AI 개발기 김 강사는 한 가방 장인과 함께 ‘가방 안에 든 물건을 인식하는 AI’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실패 경험을 공유했다. 당시 기술로는 자기장 등을 활용한 물건 인식이 불가능했다. 그는 “핵심 기술(x값)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가방 문 열림 감지, 앱 연동 등)라도 먼저 구축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능한 영역부터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이터 전문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
■ 미래 기술 트렌드와 데이터거래사의 역할
미래 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진화할까? 김 강사는 두 가지 핵심 트렌드를 제시했다.
멀티모달 AI의 부상: 과거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각각 처리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AI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융합하고 패키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획 역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거대 모델(LLM)과 소형 모델(sLLM)의 공존: GPT와 같은 거대 모델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이제 개인 PC에서도 구동 가능한 소형 언어 모델(sLLM)이 등장하며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거래사는 기업의 규모와 목적에 맞춰 거대 모델과 소형 모델을 적절히 조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데이터거래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의 파편화된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비즈니스로 완성하는 ‘총괄 기획자(Architect)’가 되어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며, 작은 성공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데이터 전문가만이 격변하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Comments